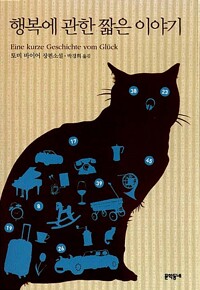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1) | ||||
| 1자료실 | 00012102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1210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책 소개
폭력, 강간, 약탈, 화재, 그리고 끔찍한 절규……
1641년 10월 독일의 작은 마을은 오랜 전쟁으로
대지도, 사람들의 삶도 갈기갈기 찢겨져버렸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언젠가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어쩌면 삼백년 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틸만 뢰리히는 탁월한 언어와 섬세한 감각으로, 권력자들이 은밀하게 꾸며놓고 자신들은 빠져나온 불행을, 정작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독자들의 피부에 와닿게 묘사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이성을 찾는 데 성공할지 모르겠다.” -《디 차이트(Die Zeit)》
* 독일 청소년문학상 수상작
역사교과서보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 작품은 독일에서 일어난 30년전쟁의 비극적인 전경을 지금, 여기로 불러낸다. 하지만 30년전쟁이 역사상 최초의 국제전이라는 둥, 전쟁이 일어난 국제정치적 맥락은 이렇더라는 둥,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전쟁이 마무리된다는 둥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야기는 없다. 저자는 다만 군인들의 약탈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할 뿐이다. 독일에서 작가, 연출가, 연극배우로 활동해온 틸만 뢰리히는 여러 편의 ‘역사소설’로 청소년과 젊은이들, 그리고 교육계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30년전쟁이라는 테마를 역사교과서로 ‘배우는 것’과 역사소설로 ‘읽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 저자는 역사교과서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전쟁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호소력 짙은 서사로 전개하고 있다.
비참 속에 피어난 희망, 그리고 축제
전쟁에 휘말린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5일간의 이야기. 1641년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이 소설은 오랜 전쟁을 겪고 있는 작은 마을 에게부시를 비춘다. 더 이상 들판에 귀리가 나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는 집쥐들만이 우글거린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50여 명. 군인들이 마을을 침입하는 날이면, 마을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하고, 살해와 약탈, 방화가 이어진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영주는 더 이상 군인들에게 급료를 주지 못하고, 대신 군인들은 마을들을 약탈하며 굶주림과 탐욕을 채우고 있다.
무두장이의 아들, 열다섯 살 소년 요켈은 군인들이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를 두려움과 싸우며, 먹을거리가 없어 어린 동생들과 함께 쥐와 풀을 찾아 헤맨다. 가슴 한켠에 소녀 카타리나를 사랑하면서. 그러다 무두장이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희망을 품고 축제를 벌이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죄
극단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마을 광장에서 그들은 함께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포도주를 마시고, 모닥불을 피우며 새로 피어날 희망을 꿈꾼다. 계속되어야 할 삶을 위해서.
하지만, 소설이 갖는 일말의 희망은 작품 말미에 수록된 한 시에 의해 산산이 조각난다. 실제로 30년전쟁을 겪은 바로크 시인 마틴 오피츠(1579~1639)의 시는 그 끔찍한 절규가 지금까지도 들리는 듯 선연하다.
소설 속에서 축제를 즐기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 여인이 말한다. “망각은 죄야.” “저들은 벌써 모든 것을 잊었어.” 그녀는 군인에게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딸아이를 다시 한 번 그리며, 축제의 광장을 빠져나온다. 하지만, 축제의 광장은 끝내 집단 학살이 얼어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만다.
이 소설은 30년전쟁에 관한 정보와 전화(戰禍)를 담고 있지만, 단 한 번도 30년전쟁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30년전쟁이란 이름은 전쟁이 종결된 후에 붙여진 이름일 테니 말이다. 전쟁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이름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삼백여 년 전 그들이 겪었던 전쟁의 비참은 계속되고 있다. 그 이름이 6ㆍ25전쟁이든, 이라크 전쟁이든, 스리랑카 내전이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든…… 전쟁은 어떠한 이름을 지니고 있든 그 자체로 끔찍하다.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의 이름이 아닌,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여기서 탐욕과 광기, 살인, 폭력, 전쟁의 맨얼굴과 대면해야 하는 이유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에게부시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불행을 견뎌내며 삼백년 후에 올지 모를 평화를 꿈꾸었고, 사랑을 믿었다. 그러나 삼백년 후 유럽의 대지는 세계대전이라는 또 다른 전화로 갈가리 찢겨져 있었다. 이 소설은 반복되는 비극적인 역사 앞에서 ‘기억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더불어, 이 작품은 1633년에 쓰인 오피츠의 서사시와 1983년에 쓰인 뢰리히의 소설을 장르적으로 내용상으로 비교하며 읽는 재미가 크다. 아마도 『어쩌면 삼백년 후에』의 모티브가 되었을 이 시를 한 행 한 행 읽어나가며, 독자들은 이 소설의 장면 장면을 다시 한 번 회상하고,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두 문학가의 시대를 초월한 만남이 제법 의미는 깊지만, 시와 소설, 그 이중주가 들려주는 평화의 웅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시대를 초월해 비극적인 지점이다.
1641년 10월 독일의 작은 마을은 오랜 전쟁으로
대지도, 사람들의 삶도 갈기갈기 찢겨져버렸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언젠가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어쩌면 삼백년 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틸만 뢰리히는 탁월한 언어와 섬세한 감각으로, 권력자들이 은밀하게 꾸며놓고 자신들은 빠져나온 불행을, 정작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독자들의 피부에 와닿게 묘사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이성을 찾는 데 성공할지 모르겠다.” -《디 차이트(Die Zeit)》
* 독일 청소년문학상 수상작
역사교과서보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 작품은 독일에서 일어난 30년전쟁의 비극적인 전경을 지금, 여기로 불러낸다. 하지만 30년전쟁이 역사상 최초의 국제전이라는 둥, 전쟁이 일어난 국제정치적 맥락은 이렇더라는 둥, 결국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전쟁이 마무리된다는 둥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야기는 없다. 저자는 다만 군인들의 약탈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할 뿐이다. 독일에서 작가, 연출가, 연극배우로 활동해온 틸만 뢰리히는 여러 편의 ‘역사소설’로 청소년과 젊은이들, 그리고 교육계에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30년전쟁이라는 테마를 역사교과서로 ‘배우는 것’과 역사소설로 ‘읽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 저자는 역사교과서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전쟁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호소력 짙은 서사로 전개하고 있다.
비참 속에 피어난 희망, 그리고 축제
전쟁에 휘말린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5일간의 이야기. 1641년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이 소설은 오랜 전쟁을 겪고 있는 작은 마을 에게부시를 비춘다. 더 이상 들판에 귀리가 나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는 집쥐들만이 우글거린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50여 명. 군인들이 마을을 침입하는 날이면, 마을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하고, 살해와 약탈, 방화가 이어진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영주는 더 이상 군인들에게 급료를 주지 못하고, 대신 군인들은 마을들을 약탈하며 굶주림과 탐욕을 채우고 있다.
무두장이의 아들, 열다섯 살 소년 요켈은 군인들이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를 두려움과 싸우며, 먹을거리가 없어 어린 동생들과 함께 쥐와 풀을 찾아 헤맨다. 가슴 한켠에 소녀 카타리나를 사랑하면서. 그러다 무두장이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희망을 품고 축제를 벌이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죄
극단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마을 광장에서 그들은 함께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포도주를 마시고, 모닥불을 피우며 새로 피어날 희망을 꿈꾼다. 계속되어야 할 삶을 위해서.
하지만, 소설이 갖는 일말의 희망은 작품 말미에 수록된 한 시에 의해 산산이 조각난다. 실제로 30년전쟁을 겪은 바로크 시인 마틴 오피츠(1579~1639)의 시는 그 끔찍한 절규가 지금까지도 들리는 듯 선연하다.
소설 속에서 축제를 즐기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 여인이 말한다. “망각은 죄야.” “저들은 벌써 모든 것을 잊었어.” 그녀는 군인에게 무자비하게 학살당한 딸아이를 다시 한 번 그리며, 축제의 광장을 빠져나온다. 하지만, 축제의 광장은 끝내 집단 학살이 얼어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만다.
이 소설은 30년전쟁에 관한 정보와 전화(戰禍)를 담고 있지만, 단 한 번도 30년전쟁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30년전쟁이란 이름은 전쟁이 종결된 후에 붙여진 이름일 테니 말이다. 전쟁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이름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삼백여 년 전 그들이 겪었던 전쟁의 비참은 계속되고 있다. 그 이름이 6ㆍ25전쟁이든, 이라크 전쟁이든, 스리랑카 내전이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든…… 전쟁은 어떠한 이름을 지니고 있든 그 자체로 끔찍하다.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의 이름이 아닌,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여기서 탐욕과 광기, 살인, 폭력, 전쟁의 맨얼굴과 대면해야 하는 이유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에게부시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불행을 견뎌내며 삼백년 후에 올지 모를 평화를 꿈꾸었고, 사랑을 믿었다. 그러나 삼백년 후 유럽의 대지는 세계대전이라는 또 다른 전화로 갈가리 찢겨져 있었다. 이 소설은 반복되는 비극적인 역사 앞에서 ‘기억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더불어, 이 작품은 1633년에 쓰인 오피츠의 서사시와 1983년에 쓰인 뢰리히의 소설을 장르적으로 내용상으로 비교하며 읽는 재미가 크다. 아마도 『어쩌면 삼백년 후에』의 모티브가 되었을 이 시를 한 행 한 행 읽어나가며, 독자들은 이 소설의 장면 장면을 다시 한 번 회상하고,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두 문학가의 시대를 초월한 만남이 제법 의미는 깊지만, 시와 소설, 그 이중주가 들려주는 평화의 웅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은 시대를 초월해 비극적인 지점이다.
목차
어쩌면 삼백년 후에
위안의 시 : 전쟁을 혐오하며
옮긴이의 말